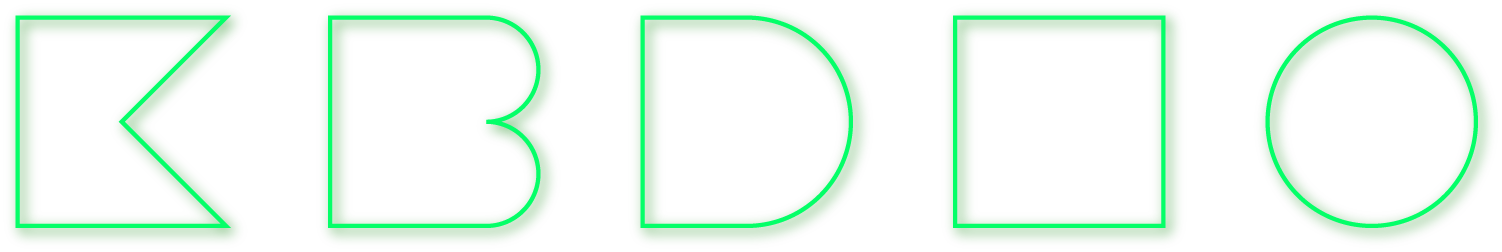스타트업 공동창업자 지분 비율은?

“우리 회사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창업도 함께한 4명이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시작했죠. 그런데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지분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투자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비 창업자’ 이제 막 법인을 설립한 창업자를 만날 기회가 자주 있다. 대다수의 창업자, 예비 창업자는 회사 내 효과적인 소통, 민주적인 의사결정 등을 회사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 문화의 첫걸음으로 공동창업자간 지분 비율을 공평하게 나누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평한 지분분배에 대해 난색을 표하거나 투자에 앞서 지분 구조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혹감에 물든 얼굴을 마주하고는 한다.“이미 법인 설립할 때 지분을 N분의 1로 분배해 두었는데, 이제 와서 멤버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죠? 회사를 떠나게 되는 건 아닐지 걱정되네요. 투자자들은 왜 이제 와서 지분구조를 바꾸라고 하는 걸까요?”
스타트업이 공동창업자 지분을 N분의 1로 나누어 시작한다면, 공동창업자들 전원의 주인의식 및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고조시키고, 핵심인력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을 수 있는 등 이상적인 구조로 여겨진다. 하지만 국내 대다수 투자자들은 다소간의 비율의 차이는 있을지 언정 대표자에게 지분을 몰아주는 것을 권장하거나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우선 스타트업의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다. 스타트업 특성상 압축적인 성장이 필수 불가결인 경우가 많으며, 그만큼 초기에 많은 의사결정을 추진력 있고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할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만약 공동 창업자 둘이서 지분 비율이 5대 5인 상황에서 창업자 쌍방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특정 한 명이 설득되기 전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기 힘들게 된다.
‘안정적인 경영권’의 확보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상법은 주식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로서 주주총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구분되는데, 보통결의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한 특별결의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M&A(인수·합병), 이사의 해임 또는 선임 등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대표자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지분율이 66.7%, 최소 50%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스티브 잡스도 ‘애플’에서, 잭 도시도 ‘트위터’(현 X)에서 해임되었던 사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 공동창업자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다. 앞서 잠깐 언급한 애플의 경우에도 공동창업자인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의 사이가 나빠진 이야기는 매우 유명하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공동창업자가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중 갑자기 이탈하거나 제3자에게 지분을 매도하는 경우 투자 유치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해당 스타트업의 생존을 위태롭게 한다.IPO(기업 공개)를 염두에 둔다면 ‘안정적 지분구조’도 필요하다.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엑싯을 위한 방법으로 IPO, M&A 등이 많이 언급된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M&A 시장이 크지 않으며 대다수의 스타트업이 IPO를 꿈꾸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상장실무 상 코스닥 등 IPO를 위해서는 대표자의 지분이 20%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호 지분의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어필 할 수 있지만, IPO 직전에 20% 이상 대표자의 지분 또는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IPO에 도달하기에 앞서 수 차례 투자 유치 과정에서 대표자의 지분이 희석된다는 점 또한 감안할 필요가 있다. 통상 시드, 시리즈 A~C, 프리(Pre) IPO 투자 등을 통해 회사를 성장시키면서 IPO에 이르기 마련이다. 대표자의 지분이 100%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각 투자 단계마다 10% 지분 희석이 이루어질 경우 위 투자 단계에서만 50% 미만으로 대표자의 지분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우에 따라 시리즈 D, E 이상으로 투자가 진행되기도 한다는 점, 그 외 스톡옵션 부여 등을 감안하면 3, 40% 이하로 지분율이 떨어지기 십상이다.“투자자들이 N 분의 1 지분 배분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어느정도 알겠어요. 그렇다면 대표가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시작하면 적절할까요?”
창업자 분들과 지분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다. 경험칙상 많은 투자자들이 대표자가 7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다만, 회사의 특성에 따라 대표자의 지분이 50% 이하인 경우 혹은 N 분의 1 등 지분 구조 속에서도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N 분의 1 배분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에 향후 플립(해외 진출을 위해 해당 국가로 본사를 이전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등을 염두하고 있다면 N 분의 1 배분도 고민해 볼 수 있다. 회사마다 공동창업자들의 역량, 배경, 회사의 특성 등이 다르기에 획일적인 정답은 없을 것이다. 또한 투자자마다 그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자와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기억할 점은 이미 분배한 지분을 다시 회수하여 재분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간, 비용이 발생하며 감정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예방할 수 있는 리스크는 미리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스타트업 설립을 앞둔 예비 창업팀이 있다면, 해당 팀의 효과적인 지분 구조는 어떠한 지 법인 설립 전에 충분히 함께 고민을 해보길 추천한다. 수평적인 조직 문화는 N 분의 1 지분 구조가 아니더라도, 지분 구조 등에 대한 멤버들 사이의 솔직한 소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