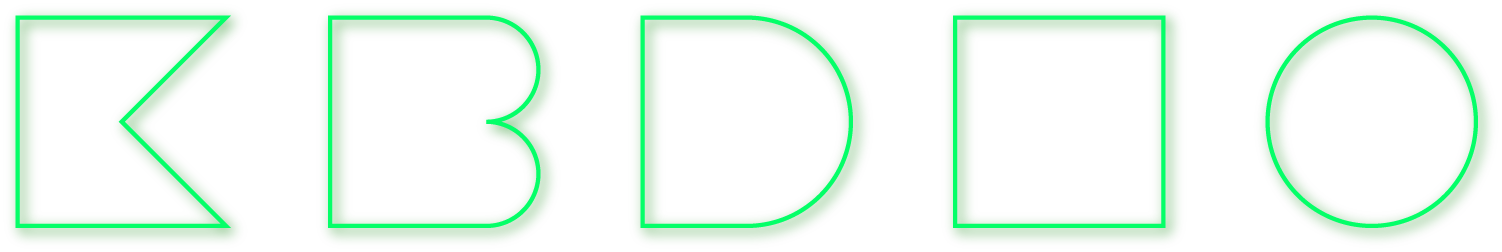사업 다각화 위해 필요하다는데…
국내 대표 해운사인 HMM이 SK해운 일부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해운 업계가 시끌시끌하다. 컨테이너선에 편중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속내지만, 한편에서는 덩치만 커져 매각이 더욱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HMM, SK해운 인수 추진
벌크선 사업 다각화 포석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SK해운 소유주인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와 매각 주관사 모건스탠리는 SK해운 탱커선, 액화석유가스(LPG)선, 벌크선 등 일부 사업부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HMM을 선정했다. 오는 3월 중순까지 실사를 진행해, 이르면 4월 SK해운 인수 안건을 이사회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SK해운은 원유선 22척, 액화천연가스(LNG)선 12척, 액화석유가스(LPG)선 14척, 벌크선 10척, 벙커링선(선박에 LNG를 연료로 공급하는 선박) 7척 등을 운용해왔다. 한앤컴퍼니는 2018년 약 1조5000억원에 SK해운을 인수해 비주력 사업부를 줄이고 낡은 선박을 매각하며 기업가치를 올려왔다. SK해운은 2023년 매출 1조8865억원, 영업이익 3671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실적이 나쁘진 않다.
다만 HMM은 SK해운의 일부 사업부 인수만 가능하다. 2014년 현대상선 시절 LNG사업부를 매각하면서 겸업 금지 조항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2029년까지 효력이 유지돼 SK해운의 LNG사업부는 이번 인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SK해운 전체 몸값이 4조원대로 추정되는데 HMM은 이번 인수 가격을 2조원대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HMM이 지금 시점에서 SK해운을 품에 안은 배경은 뭘까.
컨테이너선 사업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 이 비중을 떨어뜨리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다. HMM 전체 매출에서 컨테이너선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이른다. 컨테이너선은 해운 시장 상황에 따라 운임 변동폭이 크다. 호황일 때는 넉넉한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불황이 닥치면 이익이 급감하는 구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HMM은 지난해부터 SK해운 인수를 검토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글로벌 경기 불황에 따른 컨테이너선 운임 하락 국면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인수하는 벌크선 사업은 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그대로 실을 수 있는 화물 전용선이다. 철광석, 유연탄 같은 원자재를 주로 실어 나른다. 유조선과 LNG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등도 넓게 보면 벌크선 사업으로 분류된다. 벌크선은 화주와 장기 계약을 맺는 특성상 불황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평가다.
해운 업계 관계자는 “실적 부침을 겪은 HMM은 불황에 대비하기 위해 컨테이너선 사업 비중을 줄이는 데 안간힘을 써왔다. 지금 시점에서 SK해운 주요 사업부를 인수하는 것도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사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HMM의 컨테이너와 벌크선 사업 비중은 6 대 4 정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컨테이너선에 주력해온 HMM은 글로벌 해운 업황이 악화되자 벌크선 사업을 잇달아 매각했다.
하지만 컨테이너선 사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자 HMM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다. 현재 36척, 630만DWT(재화중량톤수·선박에 실을 수 있는 화물 최대 중량) 수준인 벌크선 사업 규모를 2030년 110척, 1256만DWT로 늘리기 위해 5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벌크선 매출을 2023년 1조2430억원에서 2030년 3조32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앞세웠다. 이렇게 되면 전체 매출에서 벌크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22%까지 높아진다.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벌크선 사업이 필요하다지만 2조원이라는 거액을 베팅하는 건 무리수가 되진 않을까. 아직까지 HMM이 보유한 현금은 넉넉한 상태다. HMM의 현금,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4조3000억원에 달한다.
한동안 주춤하던 실적도 반등에 성공했다. HMM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조5128억원으로 2023년 대비 50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도 39% 늘어난 11조7002억원에 달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코로나 특수 시기였던 2021, 2022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2022년 당시 영업이익(9조9516억원)와 비교하면 적지만,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무려 30% 수준이다. 홍해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중국 물동량 증가로 전 노선에서 운임이 상승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여세를 몰아 HMM은 1만3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컨테이너선 12척을 미주 항로에 신규 투입하고, 멕시코 신규 항로를 개설하는 등 수익성 극대화에 나섰다.

몸집 더 커져 매각 난항
“정부기관 보유 지분 줄여야”
HMM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 인수합병(M&A)에 뛰어들었지만 뒷맛이 개운치는 않다. HMM 몸집이 커질수록 새 주인을 찾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HMM은 지난해 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림그룹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돼 매각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왔다. 하림과 함께 인수전에 뛰어든 동원그룹 역시 HMM보다 덩치가 작아 ‘승자의 저주’ 우려가 컸다.
그나마 현대차, 포스코, 한화 등 현금이 넉넉한 대기업이 인수 후보로 거론되지만 막상 이들 그룹이 인수전에 뛰어들기가 녹록지 않다. 해운업 특성상 국가 수출과 직결되다 보니 정부 입김이 거센 데다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수조원에 달하는 몸값을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HMM 시가총액은 16조원 안팎으로 지난해 하림그룹이 제시한 가격(6조4000억원) 대비 10조원가량 높아졌다.
문제는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HMM 지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초 매각 협상 당시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내놓은 HMM 지분은 57.9%였다. 지난해 10월 영구채를 주식으로 추가 전환하면서 합산 지분율은 67.05%로 10%포인트가량 높아졌다. 오는 4월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보유 전환사채(CB)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이들 지분은 71.68%까지 늘어난다. 늘어난 지분을 모두 인수하려면 매수자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2000선을 웃돌았던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이 올 들어 급락하는 점도 변수다. 글로벌 해상운송 운임을 보여주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2월 21일 기준 1595.08로 집계됐다. 1월 첫째 주(2505.17) 이후 매주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SCFI가 1700선을 밑돈 건 14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 관세 도입을 예고하면서 물동량 둔화 우려가 커진 탓이다. HMM 실적이 다시 고꾸라질 경우 인수 메리트가 떨어져 매각이 더욱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
“HMM 매각에 속도를 내려면 자사주 매입, 주식 소각으로 70%에 달하는 정부기관 지분부터 줄여야 한다. 산업은행이 손을 떼고 관리기관도 해양 전문성을 갖춘 해양진흥공사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김인현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소장 의견은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