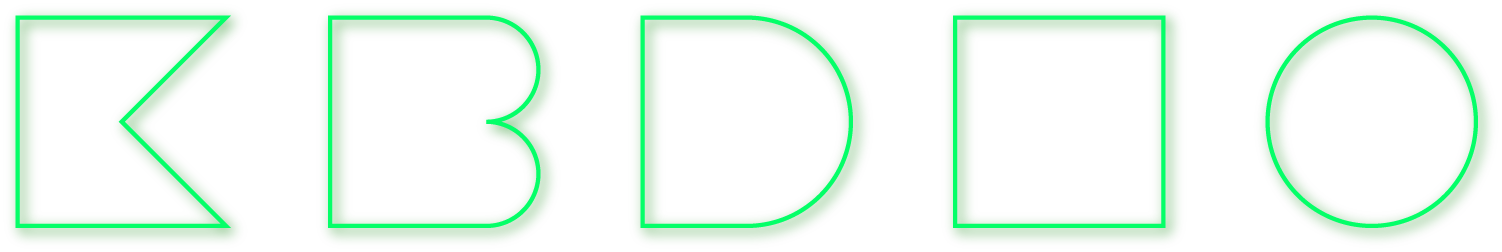정부 공격적인 쌀 매입에 대출 이자도 조절
재고부족으로 물고 물리며 가격 상승
"양곡법 개정 안해도 쌀값 방어 가능하다는 교훈"

쌀값이 곧 6만원을 넘을 기세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MIS(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쌀 20㎏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5만9763원으로 나타났다. 작년(5만3057원)보다 12.6% 높고, 평년(5만1778원)과 비교하면 15.4% 상승한 값이다. 판매 현장에선 6만원을 넘은 곳도 적지 않다. KAMIS에 따르면 전통시장 쌀 20㎏ 소매가는 평균 5만7575원이지만, 유통업체 기준으로는 평균 6만824원을 기록해 이미 6만원을 돌파했다.
쌀값이 6만대를 보이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일반적으로 쌀값이 오르는 시기인 ‘단경기(묵은쌀이 떨어지고 햅쌀이 나오기 전 기간·7~9월)’에도 마찬가지다. KAMIS 자료를 보면 7월 기준 월평균 쌀값(20㎏ 기준)이 6만원을 넘은 것은 2021년(6만1725원)이 마지막이다. 7월 평년 쌀값은 4만8706원으로 4만원대 후반이다. 최근 10년으로 기간을 넓혀봐도, 소비자 쌀값 최고치는 2023년 10월 18일 기록한 6만2022원으로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

1년 전만 해도...쌀값 폭락에 양곡법 개정 논란
지난해엔 쌀값이 너무 낮아 문제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쌀 20㎏당 산지 가격은 51345원으로 5만원대를 회복했지만, 1년 전 같은 날엔 4만5990원에 불과했다. 작년 9월 5일엔 4만3842원까지 미끄러졌다.
쌀값이 폭락하자 국회는 뒤집혔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남는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차 밀어붙였다. “농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뜩이나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쏠림 생산이 더 심화한다”며 양곡법 개정안이 ‘농망(農亡)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히려 “벼 재배면적을 8만㏊ 줄이자”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 카드를 꺼냈다. 그때만 해도 1년 안에 민주당이 집권하고 동시에 송 장관은 유임될 것이라 예상한 이는 찾기 어려웠다.
올 들어 쌀값이 이례적으로 오른 이유가 뭘까. 우선 쌀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58만5000t으로, 전년(370만2000t) 대비 3.2%(11만7000t) 감소했다. 일선 현장에선 “통계치보다 실제 쌀 생산량이 더 적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여름 지독하게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 곡식이 제대로 여물지 못했고, 벼에서 발라져 나오는 쌀알의 양도 줄었다는 설명이다. 지역농협과 미곡 종합처리장(RPC)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기 남부지역의 경우 2024년산 벼의 도정수율(벼 중량 대비 쌀의 중량)은 61~67%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예년 수준인 72%보다 5~11%포인트 낮다.
하지만 아무리 수확량이 줄었다 해도 여전히 쌀 물량이 남아돈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지난 5월 말 기준 정부 양곡 재고는 85만5000t에 달한다. 1년 수확량의 약 4분의 1이 정부 창고에 쌓여있는 형편이다. 지난달 20일 기준 민간재고량도 44만2000t으로, 2019년(46만7000t)과 비슷하다. 그런데 2019년 6월 월평균 쌀값(소매가)은 20㎏당 5만2681원으로, 올 6월(5만8150원)보다 5000원 넘게 낮았다.
정부, 쌀값 반등에 총력전...쌀 매입, '많이 빠르게'
일각에선 ‘정부 과속론’이 제기된다. 정부가 시장에서 쌀을 급격하게 너무 많이 빨아들였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국회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양곡법 개정을 추진하자 정부는 쌀값 반등에 사활을 걸었다. 정부는 쌀 생산량 예측치가 나오기 전인 작년 9월에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2005년 이후 가장 이른 시점이었다. 10월엔 통계청이 쌀 ‘예상’ 생산량을 365만7000t으로 발표하자 이를 토대로 초과 생산량(신곡 예상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보다 12만8000톤 많은 20만t을 밥쌀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는 정말로 남는 쌀이 없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연달아 보낸 것이다. 정부는 공공 비축 물량도 45만t으로 책정했다. 전년(40만톤) 대비 5만톤 늘어난 물량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벼멸구 등으로 피해입은 벼도 전량 매입해줬다. 이 결과 농식품부에 따르면 작년 정부가 매입한 쌀 전체 물량은 62만2000t으로, 전년(60만2000톤)보다 2만t 많다.
그러나 이마저도 최근 쌀값 상승을 충분히 설명하긴 어렵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2024년산 산지 쌀값(정곡 20㎏)은 작년 수확기(10~12월)에도 전년(5만699원)보다 8.9% 낮은 4만6175원이었다. 올 4월 들어서야 비로소 쌀값이 전년 수준을 역전했다.

쌀 유통업계에선 “최근 쌀값 반등의 주요 원인은 지역농협”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업계에 따르면 벼 농가는 수확한 쌀을 민간 RPC나 지역농협에 내다 판다. 지역농협은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1년 치 물량도 넉넉히 살 수 있지만, 민간 RPC는 자금력이 부족해 3~4개월 치만 사고 나중에 재고가 바닥나면 지역농협에서 추가로 사들인다. 유통업체는 이들로부터 쌀을 사들여 식당, 대형마트에 쌀을 판매한다.
"쌀 매입자금 빌려줄 때, 벼 값 더 쳐줄수록 가점줘"
정부는 지역농협이 농가 벼를 충분히 매입할 수 있도록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데, 대신 각 농협의 성과를 평가해 이자율에 차등(연 0.5~1.5%)을 둔다. 유통업계에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다는 시각이 많다. 작년 9월쯤 정부가 산지 쌀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역 농협에 ‘RPC 정부 벼 매입자금’을 빌려주면서 평가 기준을 바꿨다.
지역농협이 농가에 벼 값을 전년 대비 더 쳐줄수록 가점을 주고, 덜 주면 감점을 주는 방식이 갑자기 도입됐는데, 이 점수가 등급을 바꿀 정도로 영향력이 커 지역농협도 농가에 쳐주는 벼 값을 크게 높였다는 설명이다. 벼 매입을 위해 수십~수백억원을 정부로부터 빌려야 하는 지역농협 입장에선 연 이자율이 0.1%포인트만 변동해도 갚아야 할 이자 규모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 평가 방식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지역농협 관계자는 “평가계획 기준은 연초에 나오는데, 수확을 앞두고 갑자기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의 혼란이 컸다”고 했다.
정부의 공격적인 쌀 매입으로 재고가 떨어진 민간 RPC와 유통업체가 동시에 지역농협으로 몰리고, 쌀을 비싸게 사들인 지역농협은 이들에게 물량을 비싸게 팔고, 다시 재고가 떨어진 민간 RPC와 유통업체가 지역농협으로 몰리고…. 이런 식으로 쌀값이 물고 물리면서 오르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선 최근 지역 농협이 ‘공동사업법인’ 형태로 뭉치고 있다는 점도 쌀값이 인상되는 원인으로 지목한다. 원래 지역농협은 쌀을 비싸게 사들여 싸게 파는 역할을 한다. 쌀장사로는 적자가 나다 보니 공동사업법인 형태로 쌀값을 협의하거나, 아예 합치는 곳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쌀 유통업체 관계자는 “쌀 가격을 ‘담합’하기 쉬운 구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입점비 제도’도 소비자 쌀값을 키우는 간접적인 문제로 지목된다. 유통업계에선 “대형마트와 달리 동네에 있는 조그만 식자재 마트들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지 않아 유통사들에 입점비를 요구한다”며 “금액이 5000만~1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업체들로선 그 돈을 내고 2~3년간 거래 계약을 맺는데, 이 기간 내에 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최근 쌀값 상승에 대한 평가는 상반된다. 농가에선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이 정도 가격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통업계에선 “비용 부담이 갑자기 커지면 우리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쌀값 흐름이 주는 교훈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굳이 양곡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정부 정책으로 충분히 쌀값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많은 이들이 양곡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최근 쌀값 흐름이 주는 시사점을 깊이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