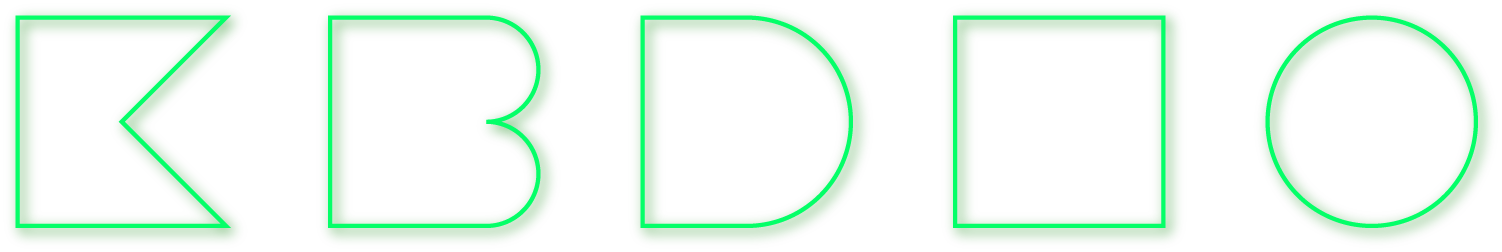정부가 집값 과열을 잡겠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정작 타격은 중저가 지역 실수요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민층의 자금줄이 막히면서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부담을 지는 ‘역진적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전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9월 담보인정비율(이하 TV) 40% 이상 거래 비중은 평균 49%였다.지역별로 보면 마포·성동 등 지역은 40%대 중반에 그쳤지만 노원(57.83%)·도봉(54.25%)·강북(67.22%) 등 중저가 지역은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강북구(67.22%), 금천구(62.15%), 성북구(62.06%), 중랑구(61.37%), 구로구(59.70%) 등이 대표적이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대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반면 강남·서초·용산·성동·마포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은 LTV 40% 이상 거래 비중이 40% 안팎에 그쳤다.즉 정부가 집값 과열을 막겠다며 도입한 대출 규제가 정작 집값 상승세가 완만했던 지역에 더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최근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LTV 한도가 70%에서 40%로 축소됐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누적 아파트값 상승률은 강북구 0.79%, 금천구 0.9%, 성북구 2.24%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강남·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처럼 집값이 안정된 지역의 실수요자들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다.
갭투자(전세 낀 매매) 규제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해 전세를 낀 매입을 금지했지만 실제 갭투자 비중은 중저가 지역보다 고가 지역이 훨씬 높았다.노원 32.3%, 도봉 21.8%, 금천 27.0%에 비해 용산(50.6%), 마포 (49.3%), 성동 (47.5%), 강남3구(37.1%)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추경호 의원은 “지역과 계층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는 형평성과 실효성을 모두 잃게 된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세분화 된 금융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