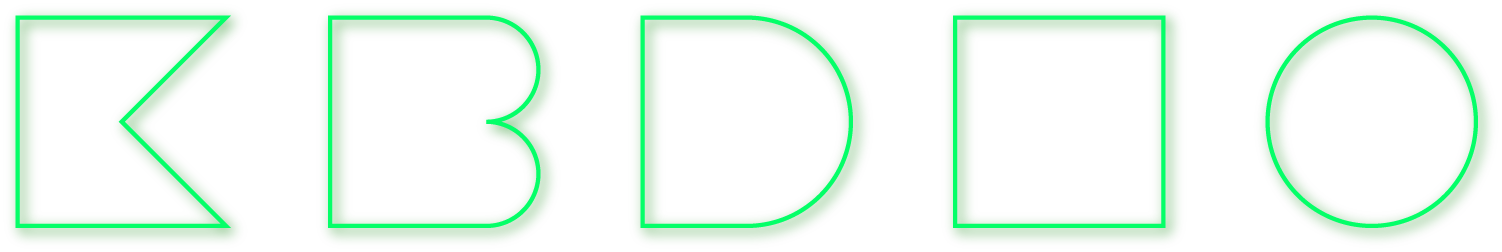10대 주력 업종 기업들 '섬뜩한 경고'
5년 후 2030년 모든 업종 中에 뒤져
'최후의 보루' 반도체마저 추월 당할듯
"규제 완화 등 효율성 높일 정책 시급"
한국 10대 주력 산업이 5년 후인 오는 2030년에는 모두 중국에 뒤처질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가 나왔다. 현재 그나마 앞서고 있는 ‘최후의 보루’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까지 중국에서 역전 당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정부의 자금 지원 확대, 규제 완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韓 산업계, 美中과 격차 더 커진다”
17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대 수출 주력 업종을 영위하는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200개사 응답)으로 설문한 결과를 보면, 기업들은 현재 수출 최대 경쟁국으로 중국(6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미국(22.5%), 일본(9.5%)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런데 5년 뒤인 2030년을 두고 같은 질문을 하자, 중국(68.5%)을 꼽은 응답 비중은 6.0%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앞으로 중국과 수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의 기업 경쟁력을 100으로 가정하고 중국의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올해 현재 102.2라고 기업들은 응답했다. 미국(107.2)보다는 낮지만 일본(93.5)보다는 높은 수치다. 다만 5년 후 중국은 112.3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112.9)과 맞먹는 수준이다. 한경협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이미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고 있고, 5년 후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대 주력 업종을 따져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산업통상부 수출입동향 자료에 따른 10대 업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컴퓨터·무선통신기기·가전),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선박, 이차전지, 선박, 석유화학·석유제품, 바이오헬스 등이다.
‘최후의 보루’ 반도체마저 추월 당해
한국 대비 중국 기업 경쟁력의 경우 올해 철강(112.7), 일반기계(108.5), 이차전지(108.4), 디스플레이(106.4), 자동차·부품(102.4) 등 5개 업종은 이미 한국을 앞질렀다. 반도체(99.3), 전기전자(99.0), 선박(96.7), 석유화학·석유제품(96.5), 바이오헬스(89.2) 등은 한국이 중국을 근소하게 앞섰다.
하지만 2030년에는 10개 업종 모두 중국이 한국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 경제 흐름을 크게 좌우하는 반도체(107.1)마저 중국에 뒤처진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중국 창신메모리(CXMT) 등은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한국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마저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 기술 격차가 2~3년 차이로 줄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전기전자(113.0), 선박(106.7), 석유화학·석유제품(106.2), 바이오헬스(100.4) 등도 중국이 앞설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 등 효율성 높일 정책 시급
한경협이 중국을 최대 경쟁국이라고 답변한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해보니, 올해 한국 대비 중국의 분야별 경쟁력(한국=100)은 △가격(130.7) △생산성(120.8) △정부 지원(112.6) △전문 인력(102.0) △핵심 기술(101.8) △상품 브랜드(96.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5년 후의 경우 △가격(130.8) △생산성(123.8) △정부 지원(115.1) △전문 인력(112.4) △핵심 기술(111.4) △상품 브랜드(106.5) 등으로 답했다. 가격 경쟁력과 정부 지원이 여전히 강한 와중에 인력, 기술, 브랜드 등마저 확 뛸 것이라는 뜻이다. 특히 브랜드 파워마저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은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들은 그 원인을 두고 국내 제품 경쟁력 약화(21.9%)와 대외 리스크 증가(20.4%)를 첫손에 꼽았다. 아울러 인구 감축 등에 따른 내수 부진(19.6%),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술 인력 부족(18.5%), 경쟁국 대비 낙후한 노동시장 및 기업 법제(11.3%) 등을 지적했다. 정부 지원 과제로는 대외 리스크 최소화(28.7%), 핵심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18.0%), 규제 완화·노동유연화(17.2%), 미래 기술 투자 지원 확대(15.9%)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