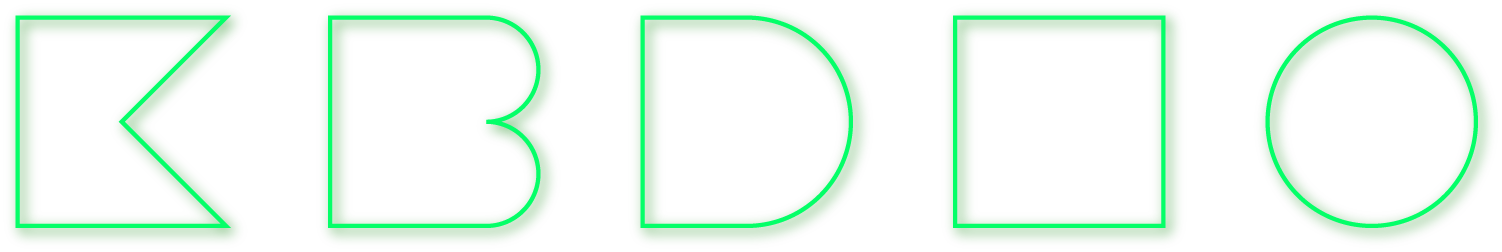태양광 핵심소재 ‘폴리실리콘·웨이퍼’ 관세 면제
동남아 생산품, 미국 시장 수출 탄력
중국산과의 차별화로 경쟁력 확보
태양광 셀·모듈은 상황 예의주시
탈중국화 공급망 재편 가속화

국내 태양광 업계의 주력 생산품 중 하나인 폴리실리콘과 웨이퍼가 미국 상호관세 면세 품목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해당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OCI홀딩스가 직접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미 시장 내 태양광 공급망 재편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16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의 쌀알’이라고 불리는 기초소재 폴리실리콘과 웨이퍼는 희귀광물, 백신용 화학소재 등 미국 정부가 직접 발표한 1039개 관세 면제 품목(HTSUS)에 포함됐다. 해당 리스트는 미국이 직접 생산하기 어려운 품목들로 구성됐고 금액으로 따지면 약 945조원에 달한다.
태양광 밸류체인의 기초소재로 불리는 폴리실리콘은 웨이퍼로 가공돼 태양광 셀의 기판 역할을 한다. 이러한 셀들을 연결해 만드는 완제품이 태양광 모듈이다.
이번 태양광 핵심 소재 면세 조치는 북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는 국내 태양광 에너지 업체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 태양광 밸류체인 확장을 추진 중인 OCI홀딩스가 대표적이다. OCI홀딩스는 현재 말레이시아를 거점으로 베트남 ,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폴리실리콘과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생산공장은 미국 수출을 겨냥한 전략적 거점으로 운영해 왔다. 이는 상호관세로 인한 미국 수출 가격 상승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46%), 말레이시아( 24%), 태국(37%) 등 동남아 주요 국가에 고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우려를 현실화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관세 면제 품목에 실리콘과 웨이퍼가 전격적으로 포함되며 OCI홀딩스는 관세 리스크를 피해갈 전망이다. 반면 중국산 태양광 제품은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로 별도 관리되고 있다.
OCI홀딩스의 말레이시아 자회사인 OCI테라서스는 현재 연 3만5000t 규모의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2027년까지 생산량을 5만6600t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국 텍사스주에 2기가와트(GW) 규모 셀 공장 증설을 계획 중이다. OCI홀딩스 관계자는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웨이퍼의 경우 관세 면제 조항과 무관하게 대중국 규제로 인해 50%가 넘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품질이 좋을 뿐 아니라 면세 효과로 가격 경쟁력도 확보한 만큼 향후 북미 시장 고객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면제로 한숨을 돌린 태양광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업계와 달리 태양광 셀·모듈 제조사인 한화큐셀은 여전히 긴장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제품과 함께 태양광 셀·모듈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품목 관세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화큐셀은 그동안 한국·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는 셀과 모듈에 대한 무관세 쿼터(할당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하지만 상호관세 여파로 관세 시나리오를 예측하기 힘든 만큼 신중하게 미국 정부 입장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 한화큐셀은 상호관세 위험을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서도 태양광 밸류체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에 추가 공장을 건설하며 잉곳, 웨이퍼, 셀 각각 3.3GW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정책을 좀 더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 태양광 산업 구조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태양광 발전을 손꼽고 있다. 이로 인해 원재료부터 모듈까지 태양광 공급망에서의 ‘탈중국화’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미국 태양광 설치 수요는 지난해 49GW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54GW로 10%가량 늘어나는 등 매년 10% 이상씩 꾸준히 성장 중이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우방국과의 공급망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며 “특히 무관세 품목 확대는 가격 안정성과 공급 다변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