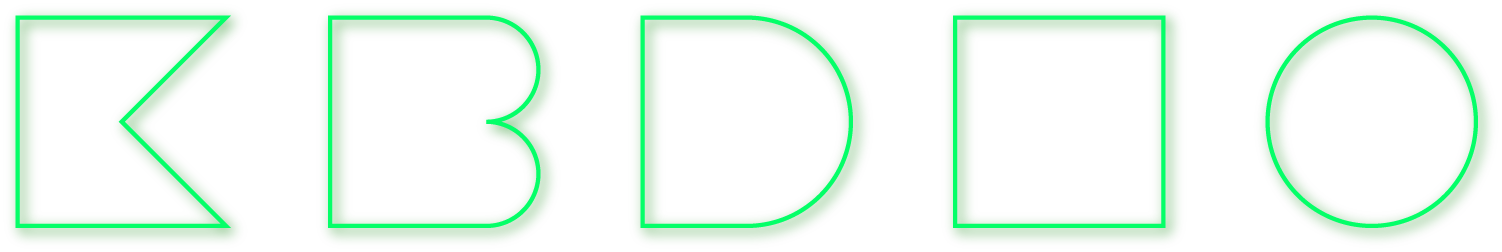전세가격이 1% 상승하면 주택 매매가격이 0.65% 오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갭투자가 1% 증가할 경우 주택 매매가격은 0.15%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은 금리, 대도시화가 주택시장 변동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한국은 전세가격, 갭투자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 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OECD 21개국과 한국 주택 시장의 변동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국내 주택 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21개국은 2010년 이후 금리가 1%포인트 내려갈 때마다 주택 가격이 4.5% 상승했다. 대도시화율이 1%p 증가하면 주택 가격은 10.3% 상승했다.
반면 한국은 전셋값과 갭투자, 금리, 주택담보대출 등이 주택 시장의 변동성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만 있는 전세 제도가 주택시장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세가격이 1% 상승할 때마다 주택 가격은 0.655% 올랐고 주택시장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는 집값 상승폭이 0.706%로 더 확대됐다.
갭투자가 1% 증가할 경우 집값은 0.148%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갭투자 1% 증가시 수도권이 0.179%, 지방이 0.128% 올라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고변동기에는 주택 매매가격이 0.198%, 저변동기에는 0.155% 상승해 고변동기에 주택 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금리 인하와 주택담보대출 역시 지방보다 수도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리 인하의 효과는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약 5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1%p 하락할 때 주택 매매가격은 0.04% 올랐는데 수도권은 0.106%, 지방은 0.0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에서만 주택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고 지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국토연구원은 주택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모기지를 운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 정책을 실시해 효과를 제고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자금의 시기적·공간적 흐름을 조절하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전세자금대출에도 DSR 규제를 도입해 대출에 의존한 전세 소비를 억제하되 저소득층, 청년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적 적용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