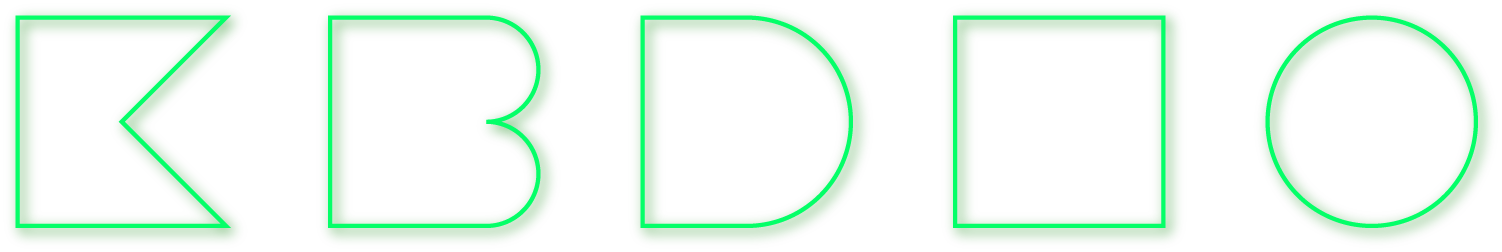“내년 상반기 인하까지 최종 기준금리가 2.25%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이미 인하 사이클이 끝날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물가상승률이 높아지자 이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3.50%까지 인상한 이후 2024년 10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다. 2024년 10월, 11월 그리고 2025년 2월과 5월 총 4차례의 인하를 단행해 기준금리는 2.50%까지 낮아졌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와 고물가의 여파로 경기의 회복세가 약한 만큼 금융시장은 한국은행이 지속해서 인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도 금융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듯이 한국은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시장은 기존 올해 3분기와 4분기에도 각각 25bp(=0.25%p)씩 인하를 단행해 2025년 말 기준금리는 2.00%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2026년까지 인하가 지속되면서 1%대의 기준금리 전망도 재기됐다.
◆많이 남지 않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력
하지만 6월 대선 이후 금융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후퇴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경기둔화였다. 더욱이 2024년 말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 그리고 2025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한국의 경기둔화 우려는 높아졌지만 정부가 경기에 대응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경기에 더 무게를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6월 선거 이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빠르게 2차 추경을 결정 및 집행하는 등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한국의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2% 하락했지만 2분기는 0.7% 상승했다. 3분기 경제 성적표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지만 전기 대비 1%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한국은행도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이유가 낮아지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력은 많지 않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 연준은 제로금리, 유럽중앙은행(ECB)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으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1.25%까지 인하했다(팬데믹 이후 0.50%까지 인하). 하지만 저금리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을 때의 기준금리가 팬데믹 직후처럼 낮게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ECB는 지난 6월 기준금리가 2.00%에 도달하자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통화정책 완화 사이클의 끝에 다가가고 있다(We are getting to the end of the monetary policy cycle)”고 언급했다.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 없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언급하는데 ECB의 중립금리가 2.00%로 거론됐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낮게 유지되면 완화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완화적 통화정책에서의 인플레이션 유발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한국은행도 중립금리 수준까지만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립금리는 이론적인 금리인 만큼 추정 값이 편차가 존재하지만 한국의 중립금리는 2.25~2.75%로 알려져 있다. 팬데믹 이후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한은 총재는 2.25%는 중립금리 하단, 2.75%는 중립금리 상단이라고 평가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은 총재의 중립금리에 대한 생각은 인하 사이클 당시 기준금리에 따른 통화정책의 강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은행 총재는 3.00%의 기준금리에 대해 ‘긴축적’, 2.75%의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긴축적 & 중립적’, 2.50%의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즉 2.50%의 기준금리에서 추가적으로 인하를 단행해 2.25%가 된다면 통화정책의 강도는 ‘중립적 & 완화적’, 2.00% 이하부터는 ‘완화적’이라는 표현이 된다.
물론 한국의 경기가 부진하다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2026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24년 말 한국의 2025~2029년 잠재성장률(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노동력·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을 1.8%로 추정한 바 있는데 2026년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는 낮지만 잠재성장률에 근접한다. 한국 경기가 뜨거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국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이유도 없다.

◆한은의 새로운 걱정 ‘부동산’
부동산 가격도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기대감을 축소하는 이유다. 한국은행은 지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실제 2024년 7월과 8월 금융시장은 한국은행이 경기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금융시장의 예상을 깨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를 뒤로 미루는 결정을 단행한 바 있다.
한국은행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우려는 2025년 이후 재차 나타나고 있다. 선거 전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27일 정부가 고강도의 수요 억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정책의 효과는 길게 가지 못했다. 결국 정부는 10월 15일 3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25차례에 가까운 부동산 대책을 경험해본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 심리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금융시장도 금리인하 기대감을 축소하고 있다. 더욱이 9월 중순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한두 달 미뤄도 경기를 잡는 데는 큰 영향이 없는데 금리 인하 시그널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더 고생한다”고 언급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당초 10월 인하를 기정사실로 보던 금융시장은 인하 시점을 11월로 후퇴했으며 연내 추가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2026년 상반기까지 한국은행의 인하 사이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인식도 나타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최종 기준금리가 2.25%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이미 인하 사이클이 끝날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 향후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