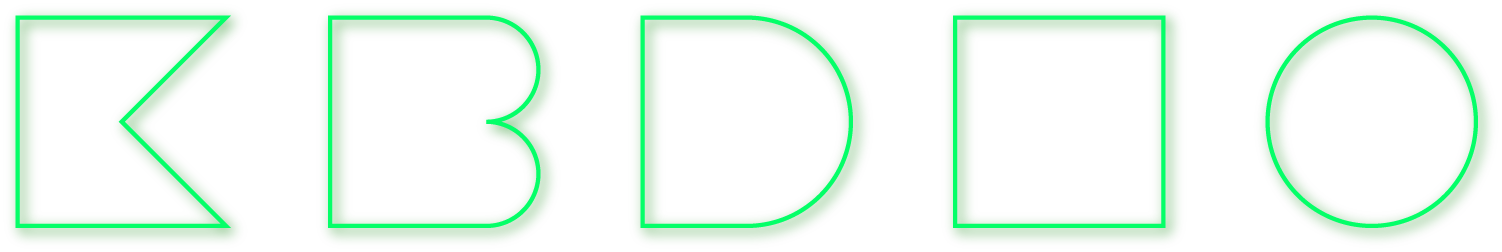한국 자본시장은 산업의 흥망성쇠를 압축한 드라마였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그 시대 한국 경제가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국가의 얼굴’이다. 1995년 창간한 한경비즈니스는 그 격동의 한가운데서 기업의 흥망을 기록해 왔다.
1990년대는 수출 기반 중공업, 2000~2010년대는 기술 중심 IT, 2020년대는 친환경·첨단산업 중심으로 이행했다. ‘수출주→기술주→차세대 산업주’로의 전환이다.
1995년 당시 한국전력은 18조9940억원으로 시총 1위를 기록하며 증시를 이끌었다. 이어 삼성전자, 포항종합제철(현 POSCO홀딩스),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대우중공업, 신한은행 등이 상위권에 자리했다. 공기업과 중후장대 제조업, 금융업이 시장을 주도했던 시기로 금융과 기간산업 중심의 ‘산업화 코리아’가 증시에 반영된 모습이었다.2000년대 들어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다. 삼성전자가 23조8960억원으로 처음 1위에 오르며 한국 증시의 독주 체제를 확립했다. 한국전력과 포스코, 기아, 현대차가 뒤를 이었고 중공업과 건설주는 점차 순위에서 밀려났다. 은행권은 통합과 합병을 거치며 하나은행 등 일부 금융사가 30위에 이름을 올렸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시기였다. 여기에 IT버블 붕괴 여파로 위기를 견딘 대기업 우량주의 위상이 더욱 단단해지는 시기였다.
2005년 이후는 중국 특수를 업고 한국 산업이 성장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며 연평균 10% 성장률을 기록했고 한국은 지리적 이점과 축적된 산업 경쟁력을 발판 삼아 소재·산업재가 수혜를 입었다.
2000년대 중반은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와 함께 소매업 전반이 성장하던 시기였다. 이마트와 백화점 사업 성장 덕분에 신세계가 시총 10위권 안에 진입했고 아모레퍼시픽, 하이트진로 등도 성장했다. 각각 26위, 28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97조700억원)는 여전히 1위를 지켰다. 2위인 한국전력(24조2200억원)의 4배를 넘었다. 한국 증시의 ‘삼성 독주 체제’가 본격화된 시점이다.2010년대 중반에는 현대차그룹이 약진했다. 그간 앞다퉈 2위 자리를 차지했던 포스코와 한국전력을 제쳤다. 시총 32조8210억원을 기록하며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의 충격에서 벗어나던 시점으로 자동차가 수출 회복을 이끌었고 화학·정유는 원자재 사이클과 맞물리며 한국 증시를 견인했다. ‘차화정’(자동차·화학·정유)의 시대였다.
2010년대 후반부터 네이버·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산업이 성장주로 부상했고 LG화학과 삼성SDI 등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각광받았다. 특히 2020년 말 삼성SDI는 시총 43조1840억원을 기록하며 3위에 등극했다.
이 시기 반도체 산업 사이클 회복이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맞물리며 슈퍼호황을 맞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2025년 10월 16일 기준 시총은 각 578조3490억원, 329조4210억원이다. 국내 증시의 3분의 1정도다.
같은 날 3위 두산에너빌리티(53조6150억원)와 5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48조2630억원) 등 전통 제조업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에너지·방산 기업들이 증시 상단에 올랐다. 현대차는 시총 49조5510억원으로 4위를 기록했다.1995년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 가운데 2025년까지 순위를 유지한 기업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전력·조선·은행이 주도하던 한국 증시는 이제 반도체·조선·방산·에너지(원전) 중심으로 재편했다.